상세 컨텐츠
본문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자에게까지 임대차관계의 승계가 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주택이라는 것이 실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하다는 의미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경우들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앞서 본 임대차 관계의 승계 대상자가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사망한 시점에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위 정리에서 짚고 싶은 점은 만일 미혼의 자식이 타지(국내에 한정)로 유학을 가서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임대차관계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로 세상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유념할 점 한 가지 (0) | 2013.10.04 |
|---|---|
| 박 시장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0) | 2013.09.01 |
|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0) | 2013.08.02 |
|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 (0) | 2013.07.19 |
| 성범죄 친고죄 폐지 (0) | 2013.07.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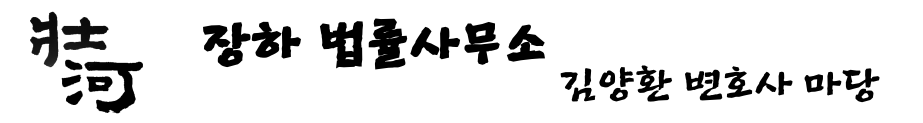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