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간 형법은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형법 제269조, 제270조), 그에 따라 임신 매우 초기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기 전에 행한 임신중절도 범죄행위가 되어 왔다.
위에 대하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예컨대 출산 직전과 같이 태아가 거의 사람이 된 시기에 살해하는 경우까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신중절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만한 적절한 시점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여 개선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참고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이를 곧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출산 직전의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나쁜 법적 공백사태가 초래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 입법개선 시점까지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결정이다(헌법재판소는 사안에 따라 법률 규정에 대하여 입법개선의 시한을 마련하고 그 시한 내에 입법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의 시한으로 임신 22주를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현행 낙태죄 규정이 입법에 의하여 개선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유효하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현행 낙태죄 규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일은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 국회가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의 소임을 다 해 주기를 기도한다.
한편 최근에 검찰은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한 낙태행위에 대하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기소하기 않기로 결정하였고, 아울러 입법개선 이전이라도 자체적인 합리적 기준을 세워 낙태행위의 잘잘못을 사안별로 따지겠다고 하니 이는 지혜로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형벌 규정에 대하여 종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인정하는 경우 제정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평가되면서, 그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사후적으로 무죄로 재평가를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0일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낙태죄 규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직전에 2012년 8월경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에 낙태죄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2012년 8월경 이후의 부분에 한하여, 그리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에 의하면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다만, 과거에도 낙태죄를 이유로 구속하거나 징역형을 집행하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므로 논의의 실익은 적어 보인다.).

'법률로 세상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변호사의 동업금지 (0) | 2019.06.15 |
|---|---|
| 소송비용 풀이 (0) | 2019.06.09 |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맥락 (0) | 2015.04.14 |
| 명예훼손죄의 성립 구조 (0) | 2015.02.26 |
| 이병헌씨 협박녀 재판 풀이 (0) | 2014.12.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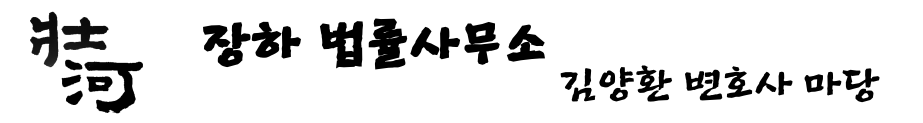

댓글 영역